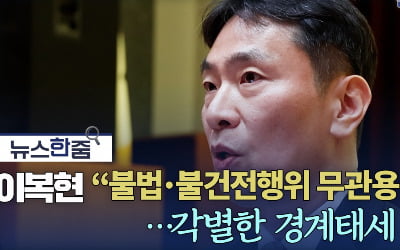전체 뉴스
-
이재명 정부, RE100 산단 '속도전'…ESG 정책 핵심 인사는
... 대표 등 지배구조·ESG 전문가들이 국정기획위원회에 대거 참여하면서 그간 추진이 지연돼온 ESG 공시 제도 등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국내 ESG 투자업계 관계자는 “ESG 공시 의무화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개정 등 주요 ESG 현안을 공정한 자본시장 조성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다각도로 조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국정기획위에 대거 참여한 만큼, 관련 정책 마련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한국경제 | 2025.07.11 15:36 | 이승균
-
[사설]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정부 개입 여지 원천 차단해야
...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관여를 원천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증시 부양이 필요한 시기에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라고 주문하거나,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 투자를 강요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행동 지침)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은 새로 만들어질 퇴직연금 기금이 제2의 국민연금이 돼 기업 경영에 시시콜콜 간섭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 지시를 내리는 DC형을 강제로 CDC형으로 ...
한국경제 | 2025.07.10 17:36
-
[서정환 칼럼] 코스피 5000시대의 조건
... 증시는 정치적 승리의 바로미터였다. 아베 전 총리는 2012년 말 취임하자마자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으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를 밀어붙였다. 그 결과 닛케이225지수는 이듬해 56.7% 급등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와 거버넌스 코드를 정비했고 일본은행과 공적연금(GPIF)은 일본 주식 투자를 늘렸다.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시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증시 생리를 ‘빠삭하게’ 꿰뚫고 ...
한국경제 | 2025.07.07 17:32 | 서정환
이미지
동영상
-
동영상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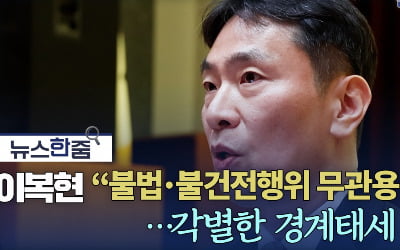
이복현 "불법·불건전행위 무관용 원칙"…각별한 경계태세 유지 [뉴스 한줌]
한국경제 | 2025.02.10 14:27
-
동영상 보기

신동승 "장기투자 문화 만들려면…기업에 확실한 보상줘야" [한국증시 2.0: K프리미엄으로⑥]
한국경제 | 2024.03.23 07:00
-
동영상 보기

류영재 "책임없는 밸류업은 테마주일 뿐…기금운용본부 독립 필요" [한국증시 2.0: K프리미엄으로④]
한국경제 | 2024.03.21 07:00
사전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business value-up program] 경제용어사전
-
... 돈이 시가총액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목표는 상장 기업이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배당 확대 및 자사주 소각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증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세제 혜택, 코리아 밸류업 지수 포함,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을 통해 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투자자들이 이를 투자 결정에 반영하도록 유도하여 자본 시장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세미나를 개최해 이 지원 방안을 ...
- 주주제안 경제용어사전
-
... 제시하는 것.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요구사항을 회사에 제출하면 주총에서 해당 의제를 다루게 된다. 배당 확대, 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이 주주제안의 단골 메뉴다. 상장사에 주주제안을 하려면 의결권이 있는 지분 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2019년 들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를 도입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주주권 행사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다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도 줄줄이 상륙하면서 주주제안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태다.
- 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 경제용어사전
-
... "수탁자책임 원칙"이라고도 한다.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단순히 주식 보유와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이 처음 도입했다. 현재까지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등 10여개 국가가 도입해 운용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등이 운용하고 있다. 영국이 처음으로 코드를 도입한 것은 ...